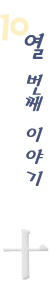|
서양의학에서는 "인간은 하나이다" 라는
명제하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개 같은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태리의 에핑거와 헤스는 사람을 교감신경긴장형과
부교감신경긴장형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미흡하지만 다음 세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류가 된다.
첫째는 커피를 마실때에 적용된다.
서양에서는 아직도 커피의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커피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커피를 하루 세잔 마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직장암에
있어 50% 예방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커피를 마시면 어떤 사람은 좋은데 다른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생기는가? 잠을 안오게 하고 흥분되게 하는 것은 커피속에 들어 있는 카페인이 원인이라는 것까지는 밝혀져 있지만 왜
카페인이 누구에게는 좋게 작용하고 누구에게는 안 좋게 작용하는가를 생각해 내지는 못하였다. 권선생님은 카페인이 부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해 주는 작용을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부교감신경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목양. 목음. 토양. 토음.
체질에게는 좋게 작용을 하지만, 교감신경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금양. 금음. 수양. 수음. 체질에게는 카페인이 저하된
부교감신경을 더욱 억제하여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 해롭게 작용하는 것이다. 유명한 아이젠하워 장군은
커피를 마실 때 반드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디카페인)를 마셨다고 한다.
두 번째로 여름에도 온수욕을 행해야 하는 사람과 겨울에도 냉수욕을 해야 몸에
좋은 사람의 구분에 있어 위의 예가 적용된다. 냉탕에서는 부교감 신경계가, 온탕에서는 교감 신경계가 항진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권선생님이 쓰신 빛과 소금 94년 10월호(체질에 따른 목욕방법)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아트로핀 주사의 예이다.
수술 후에 환자가 늦게 깨어나거나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런 때
병원은 발칵 뒤집어지게 되며 마취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아트로핀
주사에 대한 체질적인 반응 때문이다.
수술을 하기 전 병원에서 놓는 주사가 아트로핀 주사이다. 이 주사의 목적은 수술 전 환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아트로핀 주사는 부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므로 부교감 신경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목양. 목음. 토양. 토음. 체질은 그 주사를 맞으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지만,
교감 신경이 한상 긴장되어 있는 금양. 금음. 수양. 수음 체질에게는 이 주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긴장 정도를
더욱 차이 나게 하여 환자를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수술 후 늦게 깨어 나는 경우를 종종 만드는 것이다.

|